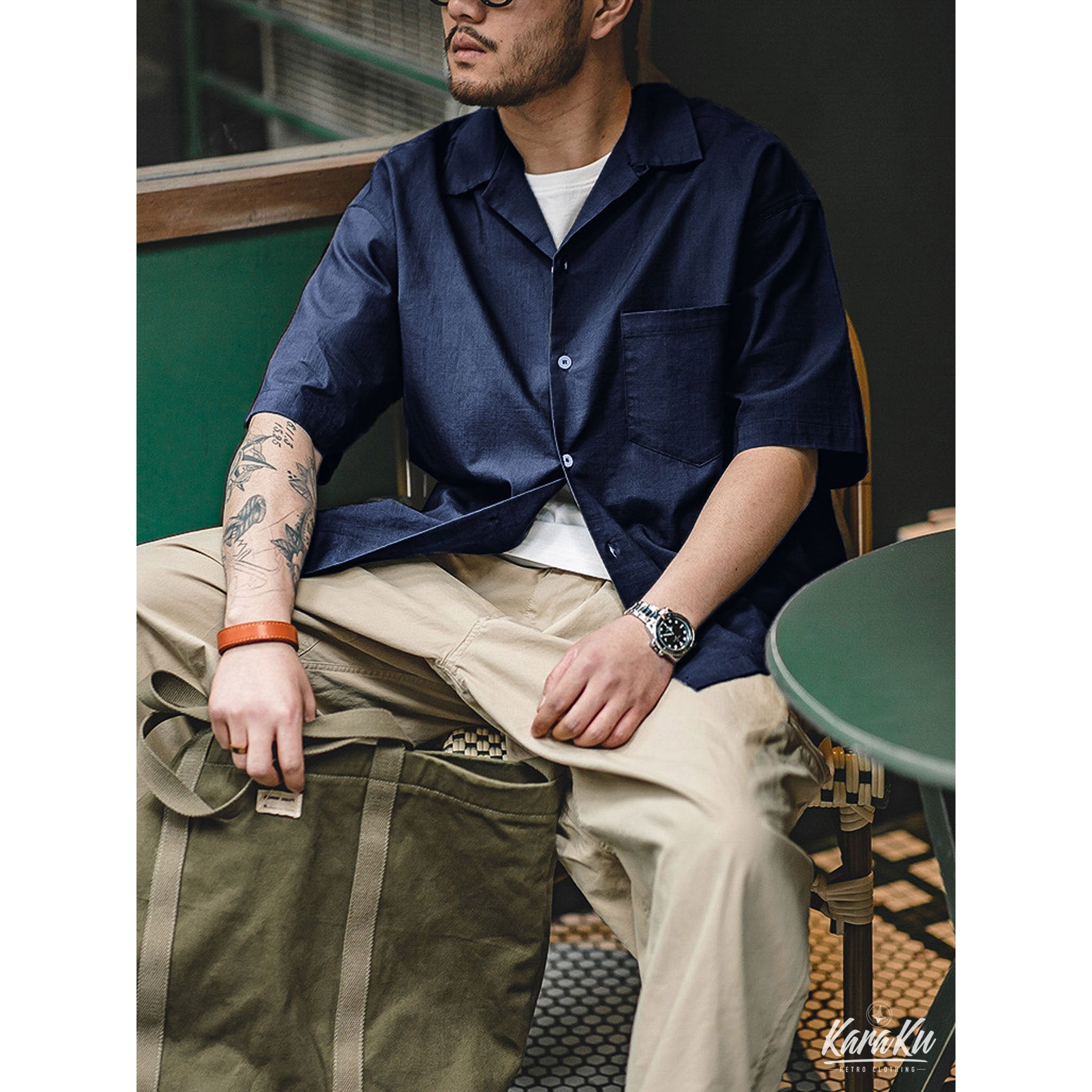아이조메
전통적으로 천연 염색은 꽃, 열매, 잎, 뿌리, 껍질 등 색을 지닌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광물, 해조류, 암균, 버섯, 이끼류 등에서 색소를 추출해 활용해 왔다. 과거에는 대부분 식물에서 얻은 염료가 사용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쪽 염료가 가장 널리 쓰였다. 천연 염색은 주로 식물성 섬유에 활용되었지만, 견이나 양모 같은 동물성 섬유에도 잘 염색되어 생활 속은 물론 전통 공예로도 자리 잡았다.
‘남(藍)’이라는 말은 단순히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藍)의 색소를 함유한 여러 초목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문헌에서는 ‘남(藍)’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한글 용어로는 ‘쪽’ 또는 ‘쪽물’이라 불렸다. 쪽은 인도와 이집트를 시작으로 전파되어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기원전 3세기 중국 문헌인 『순자』의 「권학편(勸學篇)」에는 ‘청출어람(靑出於藍)’[청(靑)은 남(藍)에서 나왔으나 남(藍)보다 더 푸르다 ;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뜻함]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이미 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고시대 염직에 대한 기록으로는 『후한서』 권85 「동이열전」에 화려한 무늬의 비단과 자수를 놓은 의복을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하기 위해 색실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미 상고시대부터 염색 기술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백제 고이왕 때에는 복색 착용 제도가 정비되었고, 신라 시대에는 염관(染官) 아래 11인의 염장(染匠)을 두었으며, 홍전(紅廛), 능색전(能色廛), 소방전(小房廛) 등 염색 관련 부서도 존재했다.
고려에 들어서는 염색을 관장하는 직염국(織染局) 내에 도염서(都染署)를 두고, 전문 장인인 염료공과 염색공이 염색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경공장(京工匠)에 청염장(靑染匠), 홍염장(紅染匠), 황단장(黃緞匠) 등을 두어 색상별로 분업화된 체계 아래 염색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염색이 민간 수공업 형태로 전환되어, 민가의 부업이나 가내 생필품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반가(班家) 이상의 서민층에서도 염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의류, 이불, 생활용품, 보자기 등의 혼수품을 중심으로 전통 염색이 가내의 비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856년 합성염료의 출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통 염색은 잠시 단절되었고,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계승·재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통 염색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전통공예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